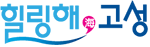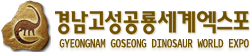마을유래
수남리(水南里)
수외(水外)
- 동명의 유래(由來)
- 소가야시대에 쌓았던 성에는 네 개의 문이 있어 각각 동문(東門), 서문(西門), 남문(南門), 수문(水門)이라 불렀다. 동, 서, 남의 세 문이 방향을 가르키는 것이었다면 수문은 서문과 남문 사이에 있었던 문으로, 수로(水路) 위에 세워졌던 문으로 추정된다. 수외마을은 바로 이 문밖에 있었던 마을이란 뜻이다. '수문밖' 또는 '숨밖'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말들이 한자화(漢字化)되면서 수외로 된 것이다.
- 마을의 형성(形成)
- 이 마을에는 문화유씨(文化柳氏)와 김해김씨(金海金氏)가 처음 입촌(入村)하여 살았다고 하나 사실(事實)을 정확히 증명할 자료가 없고, 구전(口傳)으로만 누구집 몇대가 살았다고 할 뿐이다. 그러나 고성의 유구한 역사로 미루어 볼 때, 이 마을 역시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으리라 믿어진다.
- 마을의 지세(地勢)
- 고성평야가 고성만(灣) 바다에 닿는 해안 근방의 지역인 관계로 고성읍 성내리, 서외리, 동외리의 인근지역보다 지대가 많이 낮다. 그런 연유로 장마철이면 항시 수해(水害)로부터 방심할 수 없는 지역이였으나, 지금은 대독천 개수공사 등으로 안전한 지대이다.
- 주민(住民)
- 총 가구수 388호에 1,502명(남자:728명, 여자:774명)이 거주하고 있다. 거주민의 성씨는 김해김씨(金海金氏), 진양정씨(晉陽鄭氏), 진양강씨(晉陽姜氏), 전주이씨(全州李氏) 등 다양하다.
- 주민의 생업(生業)
- 농업을 주업으로 삼는 사람은 없는 실정이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아파트 4개 동(棟)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생업도 상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 주거환경(住居環境)
- 1970년대 새마을사업이 추진되면서 초가집과 재래식 아궁이는 사라졌고 1990년대에는 이 마을에도 아파트가 건축되기 시작하면서 주변이 차츰 도시화 되어 지금은 거의 모든 가구가 입식부엌에 수세식변소로 개량했고 근년에는 기름보일러로 난방시설을 하였으며 전기, 전화, TV등 문화시설도 전 가구가 갖추게 되었다.
- 교육(敎育)
- 초등학생은 고성초등학교에 다니고 중학생은 고성중학교, 철성중학교, 고성여자중학교에 다니며 고등학생은 경남항공고등학교, 철성고등학교, 고성고등학교, 고성여자고등학교에 다닌다. 일부의 고등학생은 마산, 진주 등지에 유학하기도 한다.
- 사적(史跡) 및 기타
- 옹성(壅城)
읍사무소에서 남쪽으로 약 300m 지점, 수남리 수외마을에 흔적만 남아 있는 소가야시대의 성(城)의 일부를 일컫는다.소가야말 도왕때 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백성들을 동원하여 7년간에 걸쳐 주위길이 2km, 높이 약 10m의 성을 쌓으면서 성(城)의 중앙지점에 옹성壅城:큰성(城) 문 밖의 작은 성, 원형 또는 방형(方形)으로 성문 밖에 부설하여 성문을 보호하고 성을 든든히 지키기 위하여 만듦을 쌓았다고 한다.적이 침공하여 오면 이곳에서 사방으로 고함을 질러 상황의 위급을 알렸다고 하는데, 임진왜란 때에도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자취마저 방치된 채 신축가옥의 담벽으로 활용되고 있다. - 사두(蛇頭)골
남산(南山)의 숨밖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서 산세가 뱀의 머리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아래쪽에 자그마한 연못이 있어 농사에 큰 도움을 주었으나 지금은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옹성(壅城)
남외(南外)
- 동명의 유래(由來)
- 수남리의 4개 마을중 중심이 되는 마을로, 본래 고성군 동읍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 수남리에 편입되었다. 남외라는 마을이름은 고성읍성(固城邑城)의 남문(南門) 밖, 즉 남문의 바깥에 있는 마을이라는데서 유래되었다. 남밖이라고도 불린다.
- 마을의 형성(形成)
- 마을이 생긴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곳이 바다와 가까운 지역이라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거주가 이루어졌으리라 짐작된다. 구한말(舊韓末)까지는 50호 남짓의 가구가 거주했다고 하며 1904년 남포마을에 제방(일명 철둑)이 축조되어 바다가 육지로 변하면서 주민수가 증가하여 큰 마을이 되었다. 현재는 준 도시 형태의 마을로 다양한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 마을의 지세(地勢)
- 남외마을은 고성읍 중심지역인 성내리의 서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대부분이 저지대(低地帶)이다. 마을 중앙으로 도로가 관통하고 마을의 서쪽으로는 농경지가 펼쳐지며 그 건너에 불암내(佛岩川)가 흐르고 있다.
- 주민(住民)
- 270가구에 779명(남자:386명, 여자:39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준 도시 형태의 마을로 주민의 성씨는 매우 다양하다.
- 고성읍성(固城邑城)의 네 개 문(門)중 서쪽의 문(西門) 바깥에 자리한 마을이라 해서 서문밖 또는 서문외라 불렀는데, 이를 줄여서 서외라 하였다.
- 주민의 생업(生業)
- 농업을 주업으로 삼는 가구는 10여 가구에 불과하며 다수가 상업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공직이나 기타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 주거환경(住居環境)
- 마을의 절반이 저지대로 큰 비가 올 때면 물에 곧잘 잠기며 마을 중앙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개발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으로 스레트 지붕에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다수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현대식 주택이 늘어나고 주택구조도 입식부엌에 수세식화장실로 개량하고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부쩍 늘어났다. 전기, 전화, TV 등은 전 가구에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첨단의 정보통신기기를 갖춘 가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 교육(敎育)
- 마을 내에 고성여자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고성초등학교, 중학교는 고성읍내의 중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는 고성여자고등학교를 비롯한 고성군내의 고등학교나 인근의 진주, 마산, 통영 등지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 전설(傳說)
- 대섬(竹島)
대섬(竹島)은 고성군청에서 서남쪽으로 1km 지점에 위치한 남북 0.4km, 동서 0.1km의 돌섬으로 현재는 육지화되어 고성읍 수남동 79번지상에 가옥이 들어서 있으나 조선말기(朝鮮末期)까지만 하여도 바닷물에 둘러싸인 섬이었으며 대나무숲과 아름드리 포구나무 등 잡목이 우거져 하늘을 가렸고 갈가마귀떼가 몇 백 마리씩 날아와 서식하던 곳이기도 한다.섬지방 고깃배들이 와서 정박하여 물물교환을 하기도 하고, 특히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뭇가지가 휘는 날이면 선박들의 긴급 피난지로서의 역할도 하였으나 평소에는 한적한 바닷가 경치가 좋기로 유명하여 섬 위에 정자를 짓고 시인묵객이 거쳐가면서 한 수의 시(詩)와 그림을 남기던 곳이기도 하다.일찌기 고료 공민왕때 중랑장(中朗將)이던 호은(湖隱) 허기(許麒)가 신돈(辛旽)의 부정을 공박하는데 가담했다가 유배(流配)와서 더욱더 알려지제 되었고, 조선 태조 이성계가 호은 선생을 다시 중용하려 하였으나 선생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대의(大義)를 몸소 실천하여 대섬에 은거하니 고을의 원님이나 양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호은 선생께서는 춘추 70이 넘어 돌아가시니 김해허씨(金海許氏)의 고성지방 중시조이시다. 후손이 집터에 비를 세워 지금도 후덕(厚德)을 기리고 있는데 선생의 한 많은 일생을 알리기라도 하는 듯 밤이면 집터에 도깨비불이 자주 나타나고 그때마다 비(雨)가 왔다고 한다.
- 대섬(竹島)
구암(龜岩)
- 동명의 유래(由來)
- 오래 전부터 이 마을은 읍(邑)앞에 있는 갯마을이라 하여 읍전포(邑前浦) 또는 읍전개라 불리었다. 지금의 마을이름은 그 생긴 형태에서 연유한다. 일제시대때 간척사업을 위해 이웃한 남포마을에 제방을 쌓으면서 고성읍 교사리가지 미치던 바닷물이 빠지고 이 일대의 지형이 변하게 되었는데, 마을 뒷산에서 내려다 보면 마을의 지형이 마치 거북이와 같이 생겼다 하여 한자어(漢字語) 거북구(龜), 바위암(岩)자를 빌어 동명을 구암으로 삼았다고 한다.
- 마을의 형성(形成)
- 문서상의 기록이 없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약 200여년 전에 장흥고씨(長興高氏)기 맨먼저 이 마을에 정착하였다고 전해진다. 지금은 장흥고씨 외에 의령남씨(宜寧南氏), 진양강씨(晉陽姜氏), 김해김씨(金海金氏), 경주이씨(慶州李氏), 안동김씨(安東金氏), 경주최씨(慶州崔氏) 등 여러 성씨가 거주 하고 있다.
- 마을의 지세(地勢)
- 구암마을은 자모산(慈母山)의 산자락이 마치학(鶴)이 춤을 추며 나래를 펼치고 내려와 사방을 에워싼 형세에 거북모양 같다. 마을 앞이 바다였을 적에는 고성읍에서도 상당히 소득이 높은 마을에 속했으나, 풍수지리적 해석에 따르면 남포마을에 둑(철뚝)을 쌓으면서 거북이가 물을 잃어 현재는 옛날의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 주민(住民)
- 마을 주민은 1992년 덕성(德成)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이 많이 늘었다. 총가구수 151가구에 450명(남자:221명, 여자:229명)이 거주하고 있다. 거주민의 성씨는 장흥고씨(長興高氏), 의령남씨(宜寧南氏), 진양강씨(晉陽姜氏), 김해김씨(金海金氏), 경주이씨(慶州李氏), 안동김씨(安東金氏), 경주최씨(慶州崔氏) 등 다양한 성씨가 살고 있다.
- 주민의 생업(生業)
- 구암마을은 주업이 농업으로 논농사와 밭농사가 대종(大宗)을 이루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남포마을의 굴양식자에서 일하여 받는 노임이 소득원을 이루고 있다.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는 불과 10호 미만인 상태이고, 그나마 매년 농가(農家)는 줄어드는 실정이다.
- 주거환경(住居環境)
- 성내리를 비롯한 고성읍 의 중요 5개 동 중에서 초가집이 제일 많았다. 지금도 다른 곳에 비해 주거환경이 낙후한 편이다. 새마을사업으로 1970년대 이후 초가집은 사라졌으나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아직도 많고 최근들어 양옥에 입식부엌과 수세식화장실,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가구가 차츰 증가하고 있다. 전기, 전화, TV 등은 전 가구에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형편이 나은 가구는 기타의 문화시설도 갖추고 있다.
- 교육(敎育)
- 초등학생은 고성초등학교에, 중학생은 고성중학교, 철성중학교, 고성여자중학교에 다니며 고등학생은 고성여자고등학교, 경남항공고등학교, 철성고등학교, 고성고등학교에 다니거나 마산, 진주 등지에 유학을 가기도 한다.
- 사적(史跡) 및 기타
- 읍전정(邑前井)
인간이 주거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식수원이라 할 것이다. 읍전정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구전에 의하면 약 80년 전에는 옹달샘과 같은 작은 샘이었다고 한다.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던 일제시대 소화(昭和) 3년(1928년)에 보수를 하여 현재의 형태처럼 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실시된 수질검사에서 군내 1등을 한 적이 있다고 전하며 지금도 가뭄 때에는 마을주민은 물론 이웃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기도 한다. - 동제(洞祭)
구암마을에서는 지금도 매년 섣달 그믐날에 동제를 지내고 있다. 동제는 마을주민들의 정신적 통합체로 이루어진다. 그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전(祭前) : 마을 회의에서 마을 유지들이 제관을 선정, 택일을 하고 금기사항을 알린다.
- 고성읍성(固城邑城)의 네 개 문(門)중 서쪽의 문(西門) 바깥에 자리한 마을이라 해서 서문밖 또는 서문외라 불렀는데, 이를 줄여서 서외라 하였다.
- 읍전정(邑前井)
- 고성읍성(固城邑城)의 네 개 문(門)중 서쪽의 문(西門) 바깥에 자리한 마을이라 해서 서문밖 또는 서문외라 불렀는데, 이를 줄여서 서외라 하였다.
- 고성읍성(固城邑城)의 네 개 문(門)중 서쪽의 문(西門) 바깥에 자리한 마을이라 해서 서문밖 또는 서문외라 불렀는데, 이를 줄여서 서외라 하였다.
남포(南浦)
- 동명의 유래(由來)
- 행정구역상 수남동 구암부락에 속해 있다가 왜정말기에는 수남리 제4구였는데 그후 분동되면서 남쪽 바닷가의 포구마을이므로 이러한 이름이 정해졌다. 제방공사의 토사운반시설인 철로와 제방이 견고하다는 뜻에서 붙여진 철뚝이라는 이름으로 흔히들 부르는 마을이다.
- 마을의 형성(形成)
- 1904년 간척지 제방공사를 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맨먼저 입촌한 성씨는 김해김씨(金海金氏), 의령남씨(宜寧南氏) 등이라고 하며 이후 곡부공씨(曲阜孔氏), 김녕김씨(金寧金氏), 제주고씨(濟州高氏)등 제씨가 입촌하였고 현재는 위 성씨 외에 다양한 성씨가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 마을의 지세(地勢)
- 남산의 산자락이 해안에 이르면서 야트막한 절벽을 이루는데 구불구불 돌아간 이 절벽 아래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고성만 바다와 어우러져 아늑한 느낌을 준다.
- 주민(住民)
- 마을 주민은 총호수 127호에 주민수는 518명(남자:251명, 여자:267명)이다. 마을의 연혁이 짧은 관계로 특정 성씨는 없고 김해김씨(金海金氏), 밀양박씨(密陽朴氏), 창원황씨(昌原黃氏), 은진송씨(恩津宋氏), 전주이씨(全州李氏)등 다양한 성씨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 주민의 생업(生業)
- 남포마을은 고성읍 최남단(最南端)의 관문으로서 제2종 어항(漁港)인데 수산업협동조합이 성내리로 이전하기 전에는 남해안 일원에서 생산되는 어획물의 집산지로 융성하였고, 고성평야에서 생산되는 곡물이 인근 도서지방(욕지, 사량, 거제)에서 생산된 어획물과 물물교환되던 5일장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지금도 주민의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일부의 농민은 고성읍 일원의 죽계리, 대평리, 덕선리, 판곡리 등지에 농지(農地)를 두고 출입경작을 하고 있다.
- 주거환경(住居環境)
- 건축법상 자연녹지와 공원지역으로 묶여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초가집과 재래식 부엌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모두 사라지고 점차 기름보일러로 전환하고 있다. 전기, 전화, TV 등은 전 가구에 보급이 이루어졌다.
- 교육(敎育)
- 초등학생은 고성초등학교에 다니고 중학생은 고성중학교, 철성중학교, 고성여자중학교에 다니며, 고등학생은 고성여자고등학교, 경남항공고등학교, 철성고등학교, 고성고등학교에 다니거나 마산, 진주 등지에 유학하기도 한다.
- 사적(史跡) 및 기타
- 철뚝
고성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나 고성출신 출향인들이 '남포'하면 몰라도 '철뚝'하면 알만큼 유명한 곳이다.1904년에 간척사업을 하면서 쌓았다는 남포마을과 삼산면 판곡리를 잇는 제방으로, 토사운반 시설이던 철로와 제방이 견고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철뚝